등산의 묘미
ㅎㅍㄹ초ㅠ
2025-12-03 15:24
2,681
1
0
본문
나는 42살, 주말마다 혼자 산을 찾는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면 역시 산이 최고였다.
그날도 평소처럼 코스를 택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해 뜨기 전에 정상 찍고 내려오는 게 내 스타일이었다.
10월 중순,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다. 등산복 상의 지퍼를 올리 올리고 헤드랜턴 켜고 올라가는데, 30분쯤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누가 뒤에서 살짝 스쳤다.
“죄송해요, 길이 좁아서…”
여자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혼자였다. 헤드랜턴 불빛에 비친 얼굴이… 너무 예뻤다. 짧은 단발, 운동으로 다져진 어깨선, 숨이 차서 살짝 벌어진 입술.
“괜찮아요. 같이 올라가시죠.” 내가 먼저 말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네, 감사해요” 하며 내 뒤에 붙었다.
정상 직전 바위 구간. 그녀가 발을 헛디뎌 비명을 질렀다. 순간적으로 팔을 뻗어서 허리를 잡아챘다. 그녀의 몸이 내 가슴에 딱 붙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심장인지 그녀 심장인지 구분이 안 갔다.
정상에 도착해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10분 정도 남았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물통을 나눠 마셨다. 그녀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다. 38살, 이혼 2년 차, 등산은 3년째 취미라고.
“혼자 다니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무섭죠. 그래서 오늘은… 오빠 덕분에 마음 놓고 올라왔어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는데, 내 손에 닿자마자 뜨거워졌다.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하산길, 사람 없는 샛길로 들어섰다. 나무 그늘이 짙은 곳에서 그녀가 멈춰 섰다. “오빠.”
그녀가 내 목덜미를 끌어당겼다. 순간 입술이 맞닿았다. 산바람이 차가웠는데 입술은 뜨거웠다. 그녀의 혀가 내 입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그녀를 나무에 기대게 하고, 등산복 지퍼를 내렸다. 스포츠브라 위로 가슴이 툭 튀어나왔다. 입으로 젖꼭지를 물자 그녀가 신음하며 내 머리를 눌렀다. 바람 소리, 새소리,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가 내 바지를 내리며 속삭였다. “여기서… 해도 돼요?” 대답 대신 그녀의 레깅스를 반쯤 내렸다. 팬티는 이미 축축했다. 손가락 두 개를 넣자 그녀가 나무를 꽉 붙잡으며 다리를 떨었다.
내가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가 다리를 내 허리에 감았다. 나무에 기대선 채로, 우리는 서서 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커졌다. “조용히… 사람 올지도 몰라…” 내가 말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크게 신음했다.
절정에 이를 때 그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 오늘 처음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나도 참지 못하고 그녀 안에 다 쏟았다.
옷을 추스르고 나서, 그녀가 웃었다. “이제… 하산해야겠죠?” 나는 그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오늘은 저랑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저녁 같이 먹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토요일 새벽 북한산에서 만난다. 정상에서 해를 보고, 샛길에서 서로를 원하고, 하산 후엔 내 집에서 밤새도록 20대 때처럼 뒹군다.
42살에 만난 산속 여자. 그녀 덕분에 등산이, 인생이 다시 뜨거워졌다.
10월 중순,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다. 등산복 상의 지퍼를 올리 올리고 헤드랜턴 켜고 올라가는데, 30분쯤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누가 뒤에서 살짝 스쳤다.
“죄송해요, 길이 좁아서…”
여자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혼자였다. 헤드랜턴 불빛에 비친 얼굴이… 너무 예뻤다. 짧은 단발, 운동으로 다져진 어깨선, 숨이 차서 살짝 벌어진 입술.
“괜찮아요. 같이 올라가시죠.” 내가 먼저 말했다.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네, 감사해요” 하며 내 뒤에 붙었다.
정상 직전 바위 구간. 그녀가 발을 헛디뎌 비명을 질렀다. 순간적으로 팔을 뻗어서 허리를 잡아챘다. 그녀의 몸이 내 가슴에 딱 붙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내 심장인지 그녀 심장인지 구분이 안 갔다.
정상에 도착해서 해가 떠오를 때까지 10분 정도 남았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물통을 나눠 마셨다. 그녀 이름이 수진이라고 했다. 38살, 이혼 2년 차, 등산은 3년째 취미라고.
“혼자 다니시면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무섭죠. 그래서 오늘은… 오빠 덕분에 마음 놓고 올라왔어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는데, 내 손에 닿자마자 뜨거워졌다. 둘 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하산길, 사람 없는 샛길로 들어섰다. 나무 그늘이 짙은 곳에서 그녀가 멈춰 섰다. “오빠.”
그녀가 내 목덜미를 끌어당겼다. 순간 입술이 맞닿았다. 산바람이 차가웠는데 입술은 뜨거웠다. 그녀의 혀가 내 입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그녀를 나무에 기대게 하고, 등산복 지퍼를 내렸다. 스포츠브라 위로 가슴이 툭 튀어나왔다. 입으로 젖꼭지를 물자 그녀가 신음하며 내 머리를 눌렀다. 바람 소리, 새소리,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녀가 내 바지를 내리며 속삭였다. “여기서… 해도 돼요?” 대답 대신 그녀의 레깅스를 반쯤 내렸다. 팬티는 이미 축축했다. 손가락 두 개를 넣자 그녀가 나무를 꽉 붙잡으며 다리를 떨었다.
내가 들어가려는 순간 그녀가 다리를 내 허리에 감았다. 나무에 기대선 채로, 우리는 서서 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커졌다. “조용히… 사람 올지도 몰라…” 내가 말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크게 신음했다.
절정에 이를 때 그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 오늘 처음이에요. 이혼하고 나서…” 나도 참지 못하고 그녀 안에 다 쏟았다.
옷을 추스르고 나서, 그녀가 웃었다. “이제… 하산해야겠죠?” 나는 그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요. 오늘은 저랑 같이 내려가요. 그리고… 저녁 같이 먹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토요일 새벽 북한산에서 만난다. 정상에서 해를 보고, 샛길에서 서로를 원하고, 하산 후엔 내 집에서 밤새도록 20대 때처럼 뒹군다.
42살에 만난 산속 여자. 그녀 덕분에 등산이, 인생이 다시 뜨거워졌다.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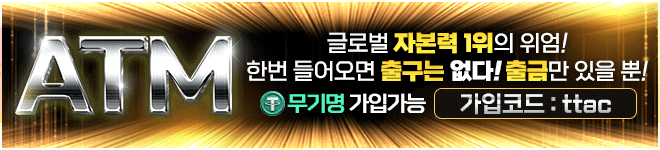




댓글목록1
나의빗자루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